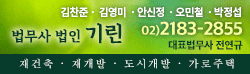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는데, 추진위원회는 구법시대에 조합설립 이전단계에 존재하던 사실상의 단체였다. 이렇게 제도밖에 존재하던 추진위원회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강남의 재건축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에 6,7개씩 구성되면서 격렬한 경쟁을 벌였다. 법적인 규제가 없었던 시절이므로 추진위원회에 대한 동의율, 동의방법, 중복동의 등의 문제도 모두 사실상의 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추진위원회를 승인받도록 정하게 된 계기는 각 사업장에 난립하는 추진위원회들이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또 정비사업을 과도하게 과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 마련된 추진위원회 제도는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라는 의도라기보다 추진위원회에 대한 규제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를 통해 강남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한 박자 늦추려는 의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런 대응책으로 추진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단계에서 조합과 사업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업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졸속으로 도입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와 모순되거나 또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잠복해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추진위원회는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과 유리된 소규모 위원회일 뿐이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는 조합과 달리 그 단체의 법률관계가 조합관계가 아니며, 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단적 성격이 강하다. 추진위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토지등소유자는 주민총회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전제로 조합원이 되는 재건축제도와는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 조합설립인가가 재판에 의해 취소되면 추진위원회가 부활하는가 하는 점도 역시 결정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도시정비법이 제정되고 7년이 넘도록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최근 분쟁의 중심에 있었던 사업장들은 대부분 이미 구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어서 추진위원회가 없었고 사업 자체도 조합설립을 넘어 관리처분의 단계를 지난 후였기 때문이다. 또 도시정비법의 경과규정에 의해 많은 사업장이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매도청구, 조합설립, 관리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봇물처럼 법원의 문을 두드릴 때 추진위원회에 대한 다툼은 비중 면에서도 항상 뒷전이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신법에 의해 사업이 시작된 현장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 소송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늦었던 구법시대의 현장들에 비해 추진위원회의 구성단계에서부터 격렬한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조합과의 관계,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등의 문제가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입법론으로 추진위원회제도는 개정을 통해 삭제되는 것이 옳고, 해석론으로 현행법상 추진위원회가 완벽하게 운영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점만 지적하고 싶다.